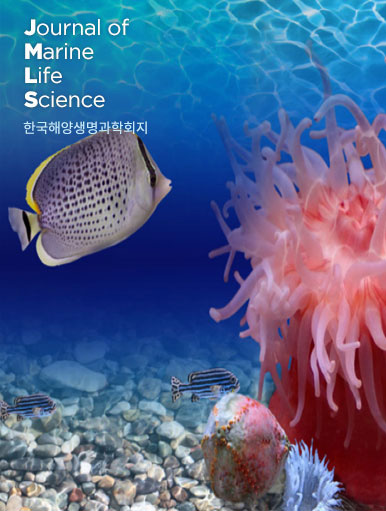서 론
우리나라 연어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만5천톤 (196 백만달러)이었으나, 2016년 2만8천톤 (256백만달러), 2018년 3만8천톤 (375백만달러), 2020년 4만2천톤 (358백만달러), 2022년 7만7천톤 (566백만달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2023년 수입량은 4만4천톤으로 2022년에 비해 급감하였으나, 수입 금액은 505백만달러로 소폭 감소함에 따라 수입금액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로 추정할 수 있다 (MOMAF, 2024). 주요 연어 수입 대상국은 노르웨이와 칠레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되는 연어의 90% 가까이는 양식산 대서양연어가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and Kim, 2024).
정부는 국내 대서양연어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21-45호, 2021. 2. 26.)를 개정하여 관계 당국에 수입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서 해외 대서양연어 수정란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이에 관련 지자체 수산연구소는 2021년부터 대서양연어 수정란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양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입되는 대서양연어 수정란은 담수에서 부화하여 앨러빈 (alevin), 프라이 (fry) 및 파르 (parr) 단계를 거쳐 스몰트 (smolt)가 되면 바다로 수송되어 해상케이지 또는 육상 순환여과 양식 시설에서 길러져 상품화된다.
국내로 공급되는 수입산 연어를 국내 자체 생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스몰트를 내수면 양식장에서 바다 양식장으로 안정 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담수 생활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생육기간이 가장 긴 파르 단계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육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광주기는 어류의 성장, 생존, 생식선 성숙 및 번식 등과 같은 어류의 생리적인 기능 (Björnsson et al., 2000)과 대사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광주기 조작을 통해 양식어류의 성장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Jobling, 1994). 대부분의 경우 광주기가 길어지면 성장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지만 (Martinez et al., 2023), 반대로 ruho (Labeo rohita)의 경우에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Shahjahan et al., 2020).
연어과 어류에서 광주기는 성장 뿐만아니라 생식 (reproduction)과 스몰트화 (smoltification)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rush et al., 1994). 기존 대서양연어와 광주기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와 다른 광주기 조건을 가진 해외 국가들에서 자연 광주기와 24시간 연속 광주기 등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대서양연어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춘분, 하지, 추분 및 동지의 대표적인 광주기와 24시간 연속 광주기와 24시간 연속 암주기 조건에서 60일간 대서양연어 파르를 사육하였을 때 성장, 생존 및 혈액성분에 미치는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어 및 실험시스템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는 ‘23년 5월 아이슬란드에서 대서양연어 (Salmo salar) 수정란을 수입하여 ‘23년 12월까지 7개월간 사육하였다. 실험어 (평균체중 11.55±0.22 g, 평균전장 12.14± 0.30 cm)는 외관적으로 질병 증상이 없고 사료 섭이가 활발한 건강한 개체를 선별하여 각 실험구에 20마리씩 수용하여 60일간 실험하였다 (Fig. 1). 실험은 원형 실험수조 (φ 0.6m, 높이 0.8m), 모래여과기 (D-500; SPLASH, Ningbo, China), 생물학적 여과 시설 (1×0.6×2m), 자외선 살균장치 (KG100; Klisglobal, Seoul, Korea) 및 냉각기 (BF-2000G; New Blue Ocean, Busan, Korea)로 구성된 순환 여과 시스템에서 수행되었다 (Fig. 2). 본 시스템의 총 수량은 약 4톤이고, 일간 사육수 환수율은 시스템 전체 수량의 약 100%로 설정 하였으며, 내부 순환율은 1일 24회전이 되도록 하였다. 물리적 여과 장치는 모래여과기를 이용하였으며, 여과기 내 걸린 고형물은 2일 1회 제거되었다. 생물학적 여과조는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형 여과재료 (φ 30 cm, 높이 1 m)를 사용하였고, 여과조 물량 대비 10% 정도를 차지하도록 구성하였다.
2. 조명장치 및 광주기 실험조건
광주기 실험에 사용한 조명은 LED Light (Eco diming forky 3-inch down light, DingSung Lighting, Repulic of Korea)를 이용하였다. 실험어가 수용된 각 실험수조는 암막 뚜껑을 덮어서 외부에서 빛이 침투되지 않도록 차단하였으며, 암막 뚜껑 중앙부에 LED Light를 설치한 후 타이머와 광 세기 조정 기능이 있는 시스템를 장착하여 설정된 광주기 시간에 일정한 광 세기가 비치도록 고안되었다 (Fig. 2). 수조 뚜껑에 부착된 LED Light와 수표면 사이의 거리는 20cm이었고, 수표면에서 수조 바닥까지의 수심은 60cm이었다.
실험구의 구성은 첫째, 24시간 연속 광주기 실험구 [Ligth 24 hour : Dark 0 hour, L24:D0], 둘째, 하지(summer solstice) 실험구 [Ligth 15 hour (09:00~24:00) : Dark 9 hour, L15:D9], 셋째, 춘분(vernal equinox)과 추분(autumn equinox) 실험구 [Ligth 12 hour (09:00~21:00) : Dark 12 hour, L12:D12], 넷째, 동지(winter solstice) 실험구 [Ligth 9 hour (09:00~18:00) : Dark 15 hour, L9:D15]. 다섯째, 24시간 연속 암주기 실험구 [Ligth 0 hour : Dark 24 hour, L0:D24]으로 하였다. 각 실험구의 조도 측정은 Illuminance Meter (LM-111, Technical & Tryco., LTD, Kanagawa, Japan)를 사용하였고, 각 수조의 표층수 (수심 0cm), 중층수 (수심 30cm) 및 저층수 (수심 60cm)를 주 1회 측정하였다 (Table 1).
3. 수질분석 및 실험사료
실험용수의 수질분석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수온, DO 및 pH는 거의 매일 측정하였고, CO2, BOD, COD, NH4+-N, NO2--N, NO3--N, Coli-form, Suspended Solid 및 Chlorophyll a는 주 1회 정도 측정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투여된 사료는 시판 중인 상품사료 (Solution R 2mm, Dibaq, Segovia, Spain)이었으며, 1일 2회로 나누어 어체 중의 3%를 투여하였다 (Table 3).
4. 성장도 측정
실험어는 실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에 체중을 측정하였고, 전일 절식시킨 후에 실험 직전에 Tricaine methanesulfonate (A5040, Sigma, St. Louis, MO, USA) 50ppm 수용액에 넣어 마취시킨 후 전자저울 (XB4200C, Precisa, Dietikon,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실험종료 시 성장 지표는 증체율 (Weight Gain, WG), 일간 성장률 (Specific Growth Rate, SGR) 및 사료효율 (Feed Efficiency, FE)를 측정하였고, 또한 생존율 (Survival Rate, SR)도 확인하였다.
5. 혈액 분석
혈액 성분 조사는 각 실험수조에서 실험어 3마리를 무작위로 꺼내어 마취시킨 후에 1cc 주사기로 미부 혈관에서 채혈하였고, 채혈된 혈액은 Heparin 처리된 튜브에 넣은 후 4℃, 8,000 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장 분리 후 사용하였다. 분석 항목은 혈장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Glucose, Sodum (Na+), Chloride (Cl-) 및 Potassium (K+)으로 자동 생화학분석기(Cobas 8000C702; Roche Diagnostics, Indianapolis, I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장 삼투압 농도 (Osmolality)는 Osmometer (2430 Multi-OSMETTE, Precision System Inc., Natick, MA, USA)로 측정하였고, 혈장 cortisol 농도는 ELISA kit (ab 108665; abcam Limited; Cambridge, UK)를 이용하여 ELISA 분석기기 (ElX800, Biotek, Santa Clara, US)로 측정하였다.
6. 통계분석
실험은 성장 및 생존에 대해서 2 반복으로 하였고, 혈액성분은 3 반복으로 실시하였다.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성은 SPSS 통계 프로그램 (Ver. 20, SPSS Inc., IBM, New York, US)을 이용하여 ANOVA test를 실시하였고, Turkey’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P<0.05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과 및 고찰
광주기 차이에 따른 대서양연어의 생존율 변화는 실험종료 시 측정되었다 (Table 4). L24:D0는 90.0±0.0%, L15:D9는 90.0±7.07%, L12:D12는 87.5±3.54%, L9:D15는 97.5± 3.54% 및 L0:D24 실험구는 97.5±3.54%로 측정되었으나, 각 실험구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Lundgvist (1980)는 강에서 잡힌 2년생 미성숙한 대서양연어 파르로 가을철에 광주기 변화에 따른 성장도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광주기가 긴 L20:D4 실험구의 성장도는 광주기가 짧은 L6:D18 실험구와 자연 광주기 실험구에 비해 좀 더 빠른 성장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성 성숙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대서양연어 파르를 겨울부터 시작하여 6개월 동안 자연 광주기와 24시간 연속 광주기 조건에 노출시킨 결과, 광주기가 긴 연속 광주기 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도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 여름철에 이르러서는 낮의 길이가 길어져 자연 광주기 그룹과 24시간 연속 광주기 그룹 사이에 성장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광주기 길이와 대서양연어 성장도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Villarreal et al., 1988). Stefansson et al. (1991)은 대서양연어 1+smolt를 자연 광주기 실험구와 24시간 연속 광주기 실험구에서 성장도 실험을 실시한 결과, 24시간 연속 광주기 실험구는 자연 광주기 실험구에 비해 성장도 향상과 스몰트화를 위한 염분 내성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고, 혈장 성장호르몬 농도도 실험 초기에 24시간 연속 광주기 실험구가 자연 광주기 실험구보다 먼저 상승한다고 보고 하였다. McCormick et al. (1995)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대서양연어 치어를 5개월간 24시간 연속 광주기 실험구, L15:D9 실험구, L9:D15 실험구에 노출시킨 결과, 광주기가 길면 길수록 혈장 성장호르몬과 아가미 Na+, K+-ATPase 활성이 더 일찍 증가하고, 광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들 호르몬의 활성이 지연되거나 약화된다고 주장하였다. Imsland et al. (2017)은 해수에서 상업적 규모로 1년간 24시간 연속 광주기에 노출된 대서양연어 post smolt의 성장도는 자연 광주기에 노출된 개체들보다 13~20 % 정도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해수에서 성장도가 급속히 상승하는 post smolt 단계에서 나타난 결과로 담수에서 성장이 비교적 느린 파르 단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서양연어 파르의 성장도 변화를 보이는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Martinez et al. (2023)은 대서양연어 파르 (98g 정도)를 담수에서 4개월 동안 24시간 연속 광주기와 자연 광주기에 노출시킨 후 성장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3개월까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4개월째부터 24시간 연속 광주기 실험구에서 성장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보고하여 성장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광주기 노출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종료 시 증체율 (WG)은 L24:D0는 186.46%, L15:D9는 182.07%, L12:D12는 184.50%, L9:D15는 177.88% 및 L0:D24는 166.37%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광주기가 길면 길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간성장률 (SGR)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광주기가 긴 L24:D0, L15:D9 및 L12:D12 는 1.73~1.75% 정도로 측정되었으나, 광주기가 짧은 L9:D15는 1.70%, L0:D24는 1.63%로 나타나 긴 광주기 실험구에 비해 낮았다. 사료효율 (FE)은 L24:D0의 경우 90.04%로 가장 높았으며 L15:D9는 89.16%, L12:D12는 88.09%, L9:D15는 85.93%, L0:D24는 78.83%로 나타나 광주기가 짧아질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Table 4). 그러나 본 실험에서 실험한 대서양연어의 모든 성장 관련 항목들은 서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존 광주기와 대서양연어의 성장과에 관한 연구들은 실험 기간이 3개월에서 1년 정도 장기간에 진행한 결과로서 본 연구의 실험기 간인 60일보다는 길어서 성장도 향상 효과가 더 뚜렷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혈장 ALT는 대부분의 척추동물의 간세포에 존재하며, 간 기능의 검사지표로 사용된다.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간세포가 단기간 및 장기간에 걸쳐 파괴되면 혈액 중에서 이들 효소의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Kang et al., 2007). 혈장 AST의 경우는 보통 간, 심장, 근육조직, 췌장 및 신장에서 발견되는데, 혈액 내에서 낮은 수치가 측정되지만 심장이나 간과 같은 조직이나 기관이 손상을 받으면 혈중으로 AST가 방출되어 농도가 상승하게 되어 혈액 내 AST의 양은 조직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Dasgupta, 2015). 본 실험종료 시 혈액성분의 분석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ALT의 경우, L24:D0에서 52.0±7.8 U L-1로 나타나서 다른 실험구의 12.7~16.7 U L-1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AST 결과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는데, L24:D0에서 1,120±143.9 U L-1로 분석되어 다른 실험구 결과인 384.0~418.7 U L-1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지개송어 치어에 L24:D0과 L12:D12 광주기 조건에서 3개월간 사육했을 때 ALT는 L12:D12에서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에 AST는 L24:D0에서 유의한 상승을 보여 간 손상이 유발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Xu et al., 2022).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치어를 L8:D16, L12:D12, L16:D8, L20:D4 및 L24:D0에 노출시켰을 때 ALT와 AST는 L20:D4와 L12:D12에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Malinovskyi et al. (2022)는 L12:D12와 L16:D8에서 ALT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어 광주기의 변화가 간 손상과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Cortisol은 연어과 어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glucocorticoiod hormone으로서 스트레스 여부를 측정하는데 자주 활용되고 있는 효소이다 (Donaldson, 1981).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cortisol 농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이후에 회복반응이 쉽게 일어나지만, 장기간의 cortisol 농도상승은 면역이 억제될 수 있고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ast et al., 2008).
어류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혈중 glucose 활성도도 상승할 수 있는데 (Pottinger and Carrick, 1999), 단기적으로 높은 glucose 농도는 스트레스 반응 중에 발생하는 혈중 catecholamines 의 급격한 증가의 결과로 매개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cortisoldependent gluconeogenesis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Vijayan et al., 1997). Rijn et al. (2024)는 대서양연어 파르를 담수에서 8주 동안 광주기 L8:D16에 노출했을 때 변화가 없었으나, L24:D0에 노출했을 때는 혈장 cortisol 농도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무지개송어 치어에 대한 광주기의 스트레스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L10:D14에서 14일, L24:D0에서 60일, L10:D14일에서 30일 및 L12:D12에서 30일간 연속으로 노출시킨 결과, 실험어의 혈장 cortisol 농도는 유의하게 상승되어 광주기 변화에 대해 연어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Leonardi and Klempau, 2003). 이러한 경향은 자연 환경에서도 나타나는데 겨울을 지나 봄으로 접어들면서 광주기가 길어지는 시기에 혈장 cortisol 수준이 증가된다고 알려졌다 (Björnsson et al., 2011). 대서양연어에 겨울 신호 (winter signal)를 준 그룹이 24시간 연속 광주기 그룹보다 cortisol 상승이 더 컸다고 보고되어 광주기 변동 자체도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Martinez et al., 2021).
광주기 조작은 어류의 생리적 항상성 (physiological homeostasis)을 방해하여 혈액학적 요소들에 변화를 유발하는데, 이는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혈중 glucose가 증가됨으로 어류의 도피성 또는 공격성 반응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Zahangir et al., 2015). Rohu (Labeo rohita)를 대상으로 광주기 시간을 연장시킨 결과, 혈중 glucose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Shahjahan et al., 2020).
본 연구에서 혈장 cortisol 농도는 L24:D0 실험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L15:D9, L9:15 및 L0:D24 실험구와는 유의차는 없었다. 그러나 L12:D12 실험구는 다른 실험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혈중 glucose 농도는 L24:D0 실험구가 다른 모든 실험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L24:D0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혈장 무기성분인 sodium 농도 범위는 155.67~ 159.67 mmol L-1 이었고, chloride 농도 범위는 127.00~ 130.00mmol L-1, potassium 농도 범위는 0.40~0.48 mmol L-1로 나타났고, osmolality의 경우도 315.33~329.00 mOsm/ kgH2로 조사되었다. 혈장 sodium, chloride, potassium 및 osmolality는 실험구 사이에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Oldham et al. (2023)이 실험한 담수에서 대서양연어 파르를 11주간 24시간 연속 광주기 그룹과 빛을 차단한 그룹 간에 혈장 calcium, potassium, chloride 및 osmolality를 측정한 결과, 각 실험구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Martinez et al. (2023)는 담수에서 대서양연어 pre-smolt를 대상으로 24시간 연속 광주기와 자연 광주기에 대한 혈중 chloride 농도의 변화는 연구한 결과, 광주기 조건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는 대서양연어 파르를 담수에서 60일간 각 광주기 조건, L24:D0, L15:D9, L12:D12, L9:D15 및 L0:D24에 노출시켰을 때 생존 및 성장에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L24:D0에서는 조직손상과 스트레스 지표인 혈장 ALT 및 AST와 cortisol 및 glucose는 유의하게 상승하여 대서양연어에 간 손상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