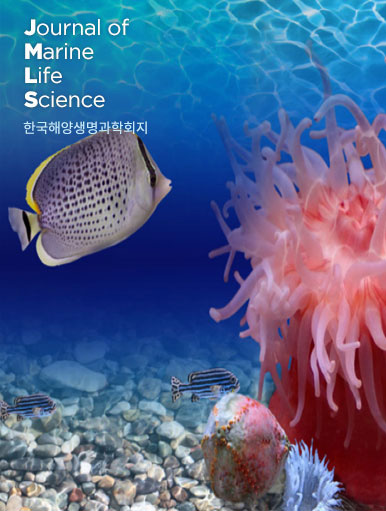서 론
붕장어(Conger myriaster)는 뱀장어목(Anguilliformes) 붕장어과(Congridae)에 속하는 어류로 우리나라 연근해, 일본, 동중국해 등을 포함한 온대 지역에 분포하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종이다. 주로 모래나 개펄로 구성된 연안 및 기수역에서 서식하고(Yagi et al., 2010;Kim et al., 2011), 성장한 붕장어는 산란기에 산란장으로 추정되는 마리아나 해구 서쪽의 규슈-팔라우 해령으로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ler et al., 2011;Kurogi et al., 2012). 부화한 자어는 북적도 해류 및 구로시오 해류를 따라 엽상자어(Leptocephalus) 형태로 우리나라, 일본 등의 연안으로 이동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5~6월에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대량으로 혼획되고 있다(Hong and Han, 2023). 하지만, 혼획된 자어는 대부분 폐기되고 있어 연근해 붕장어 자원 손실이 심각하다.
붕장어의 주요 소비국 중 하나인 일본의 붕장어 어획량은 환경 파괴, 남획 등으로 1995년 12,987톤에서 2022년 2,200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Tokai et al., 2002;Tabeta et al., 2015;MAFF, 2022), 최근 우리나라 붕장어 어획량도 2007년 19,399톤에서 2022년 12,777톤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KOSIS, 2023), 선제적인 자원관리 및 양식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붕장어 관련 연구는 생식(Okamura et al., 2000), 생태(Mochioka, 2001), 성장(Gorie and Ohtani, 1997), 산란장 추적(Kurogi et al., 2012), 암·수컷 친어 성성숙 유도(Horie et al., 2001;Fueda et al., 2019), 인공 수정란 및 초기 부화자어 생산(Horie et al., 2002)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양성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수온, 염분 및 용존산소와 같은 사육환경은 어류 양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적정 범위를 벗어난 사육환경은 어류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와 같은 스트레스 반응은 어종, 성장 단계 및 노출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Chang et al., 1996;Hiroi et al., 1997;Chang et al., 2002;Han et al., 2003;Park et al., 2009). 특히, 어류는 급격한 염분 변화 또는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염분 조건에서 체내 수분과 이온 균형에 혼란이 발생하여 삼투압 조절 장애를 겪게 되며, 장기간 노출 시 성장 지연, 조직 괴사, 면역력 저하를 통해 최종적으로 폐사하게 된다(Singly and Chavin, 1971;Harris and Bird, 2000;Oh et al., 2014). 자연수계에 서식하는 어류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노출되면 회피하거나 은신이 가능하지만, 양식 어류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육되므로 환경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Chang and Hur,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96시간 급성 염분 노출에 따른 붕장어 치어의 생존율, 반수치사농도(Lethal concentration, LC50),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 및 간과 아가미의 조직학적 변화를 조사하여 붕장어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어
실험어인 붕장어의 치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수연안 낭장망에서 포획한 붕장어 엽상자어를 남해수산연구소 생물사육동으로 운송하여 순치하여 변태를 유도하였고, 변태가 완료된 붕장어 치어는 500 L 유수식 원형수조 (Ф1 × 0.6 m)에 입식하여 실험개시 전까지 양성하였다. 양성기간동안 사육수의 수온, 용존산소, 염분 및 pH는 각 19.4±2.1℃, 6.0±0.7 mg/L, 33.5±0.4 practical salinity unit (psu) 및 8.3±0.2였다. 시험어의 안정을 위해서 pvc 재질의 은신처를 설치하였고, 사료는 시판되는 뱀장어용 배합사료(Crude protein 55%)를 1일 1회 만복공급하였다. 실험어는 실험개시 전 24시간 절식 후 실험에 이용하였고, 실험개시 시 실험어의 평균 전장은 18.9±0.2 cm, 평균 체중은 8.7±0.2 g였다.
2. 염분 노출 실험
실험구의 염분 농도는 30, 20, 10, 5, 3 및 0 psu로 설정하였고, 대조구는 자연해수(33 psu)로 설정하였다. 실험수조는 500 L 유수식 원형수조 (Ф1 × 0.6 m)를 이용하였다. 실험 염분 농도로 조절된 실험수조에 실험어를 각 10마리씩 입식하였고,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실험은 96시간동안 수행하였고, 실험기간동안 사육수의 환수량은 1일 10회전이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먹이는 공급하지 않았다. 수온, 용존산소, 염분 및 pH는 수질측정기(Professional plus, YSI Inc., USA)를 이용하여 매일 9시부터 10시 사이에 1회 측정하였고, 수온은 20.7±0.9℃, 용존산 소는 6.5±0.4 mg/L, pH는 8.3±0.2로 유지되었다. 본 실험은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NIFS-2023-50)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
3. 생존율, 반수치사농도(LC50)
생존율은 실험기간 동안 1일 1회 동일한 시간에 생존 개체 수를 계수하여 조사하였고, 정상적인 유영 능력을 상실하고 복부가 뒤집혀진 개체는 폐사로 판단하였다. 성장률은 실험종료 시에 측정하였으나, 폐사가 발생한 0 및 3 psu 실험구의 경우 5마리 이하로 생존하였을 때 측정하였다. 염분 농도에 따른 반 수치사농도(LC50)은 SPSS statistics 프로그램(v19.0, IBM,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혈중 Cortisol 농도
염분 노출에 따른 실험어의 혈중 Cortisol 농도를 분석하였다. 실험종료 시 각 실험구마다 5마리씩 무작위로 2-phenoxyethanol (200 ppm, Sigma, USA)에 마취시켜 체중을 측정한 후 항응고제(heparin) 처리된 1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미부혈관에서 채혈하 였다. 실험종료 전 폐사가 발생한 3 psu 실험구는 5마리 이하로 생존하였을 때 체중을 측정하고 채혈하였다. 채혈한 혈액은 원심 분리(6,000 rpm, 15 min, 4℃)하여 혈장을 분리하고, 분석 전까지 –70℃에서 보관하였다.
혈중 Cortisol은 시판되는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kit (EIA-1993, DRG co., USA)로 분석하였고, 45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Magellan (v17.2, Tecan, Swizerland)으로 농도를 계산하였다.
5. 조직학적 분석
염분 노출에 따른 간과 아가미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시료를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하였고, 고정된 조직은 흐르는 물에서 24시간 동안 수세한 후 탈수 및 paraffin 포매 과정을 거쳤다. 이후 Microtome (RM 2135, Leica, Germany)을 이용해 4∼5 μm 두께로 박절하여 연속절편을 제작하였고, 제작된 절편은 H-E (hematoxylin-eosin) 비교 염색 후 광학현미경(DM3000, Leica, Germany)을 이용하여 검경하였다.
6. 통계분석
모든 결과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냈다. 실험구 사이의 유의성은 SPSS statistics 프로그램(v19.0, IBM, USA)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분석하였다(p<0.05).
결과
1. 생존율 및 반수치사농도(LC50)
96시간 동안 다양한 염분 농도에 급성 노출 후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대조구, 30, 20 및 10 psu 실험구는 실험기간 동안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5 psu 실험구는 실험개시 후 48시간째부터 폐사가 발생하여 실험종료 시 생존율은 40%로 나타났고, 3 psu 실험구는 실험개시 후 48시간째부터 폐사가 발생하여 실험개시 후 72시간째 전량 폐사하였으며, 0 psu 실험구는 실험개시 후 24시간째 전량 폐사하였다(Fig. 1). 노출 염분에 따른 생존율 결과를 이용하여 96시간 급성 노출에 따른 반수치사농도(LC50)를 분석한 결과, LC50은 5.33 psu로 나타났다(Table 1).
2. 체중 변화
염분 농도 5 및 3 psu 실험구에서 다른 실험구들보다 체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Table 2). 체중이 증가한 실험구를 해부하여 조사한 결과, 실험어의 복부가 부풀고 위장 내 수분이 가득차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3. 혈중 Cortisol 농도 변화
염분 농도에 따른 혈중 cortisol 농도를 조사한 결과, 실험종료 시 대조구, 30, 20, 10, 5 및 3 psu 실험구의 혈중 cortisol 농도는 각각 49.1±9.0, 54.8±16.0, 48.4±7.9, 65.7±17.5, 80.3±10.1, 154.7±32.9 ng/mL으로 나타났으며, 3 psu에서 다른 실험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ig. 2, p<0.05).
4. 간과 아가미의 조직학적 변화
간의 조직학적 관찰 결과, 대조구, 30 및 20 psu 실험구는 간세포내 glycogen 축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실험구 사이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3A, 3B). 하지만 10 및 5 psu 실험구의 경우 간세포 내 glycogen 축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간조직 내 공포상 지질방울들의 증가가 관찰되었다(Fig. 3C, 3D). 3 psu 실험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간세포의 응축과 괴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간조직 내 지질화 현상이 나타났다(Table 3, Fig. 3E).
아가미의 조직학적 관찰 결과, 대조구와 30 psu 실험구는 새판의 규칙적인 배열을 보이며 일반적인 경골어류 아가미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4A). 그러나, 20 및 10 psu 실험구는 새판 모세혈관 내 혈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4B, 4C). 5 및 3 psu 실험구에서는 새판 상피층의 박리, 새판 상피의 융합 현상이 나타났고, 곤봉형으로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 현상이 관찰되었다(Fig. 4D, 4E). 새판 상피층의 박리 및 모세혈관 확장 현상은 5 psu 보다 3 psu 실험구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Table 3, Fig. 4F).
고찰
어류는 내성한계 수준의 염분 농도에 급격하게 노출 시 평형 감각 상실, 불안정한 유영활동, 호흡 곤란, 체내 대사활동 교란, 혈액의 성분 및 성상 변화 등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폐사에 이르게 된다(Amin et al.,2016;Yoon, 2021). 이와 같은 급성 염분 노출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과 삼투압 조절 능력은 광염성(euryhaline) 또는 협염성(stenohaline) 어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Oh et al., 2014). 붕장어 치어는 5 psu에서 실험종료 시 40%의 생존율을 보였으나, 3 및 0 psu에서는 노출 72시간째와 24시간째에 전량 폐사 하였다. 급성 저염분 노출에 따른 타 어종의 연구에서 점농어 Lateolabrax maculatus 치어(평균 체중 1.6±0.3 g)는 0 psu에서 96시간 동안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고(Yang et al., 2021),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i (평균 체중 97.4±1.7 g)은 3.8 psu에서 노출 96시간째 73.3%의 폐사율을 보였으며(Oh et al., 2014),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치어(평균 전장 9.8±0.8 cm)는 0 psu에서 노출 96시간째 50%의 폐사율을 보였으나(Hur et al., 2002), 참돔 Pagrus major 치어(평균 체중 54.2±9.3 g)는 7.3 psu에서 노출 48시간째 전량 폐사하였다고 보고되었다(Yoon, 2021). 이와 같은 결과들과 비교하였을 때 붕장어 치어의 96시간 급성 저염분 노출에 따른 생존율은 점농어, 조피볼락 및 넙치보다 다소 낮고 참돔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의 삼투압 조절은 주로 아가미(gill), 소화관(gastrointestinal track) 및 신장(kidney)에서 이루어지며(Laurent and Kunel, 1980;Gonzalez, 2012), 일반적으로 삼투압 농도가 체내보다 낮은 환경에 노출된 경우 체내 수분과 이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가미의 이온세포(ionocytes) 수, 크기 및 Na+-K+- ATPase 활성 감소와 같은 고삼투압조절(hyper-osmoregulation) 을 통해 이온을 체내로 흡수하고 수분을 체외로 방출하지만, 극단적으로 삼투압 농도가 낮은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아가미의 이온세포(ionocytes) 수와 크기, Na+-K+-ATPase 활성 증가 등 고삼투압조절과 다른 적응 전략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Kültz, 2015). 광염성 어종인 숭어 Mugil cephalus 치어(평균 체중 20.0±0.5 g)는 단계적인 염분 변화에 노출된 경우와 다르게 극단적인 저염분에 노출시킨 경우 일부 개체에서 급격한 삼투조절 압력에 의한 스트레스로 장관의 수분배출 및 이온 조절에 실패하여 복수증(hydroperitoneum)이 관찰된 바 있다(Chang et al., 1996). 즉, 5와 3 psu에서 붕장어의 체중 증가와 위장 내 수분이 가득찬 증상은 급격한 염분 노출이 붕장어 치어가 적응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극단적인 염분 변화로 작용하여 일반적인 고삼투압조절과는 다른 삼투압조절 기작이 활성화 된 것으로 보여지며, 최종적으로 염분 적응에 실패하여 체내 이온 조절과 소화관의 수분 배출 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붕장어 치어의 혈중 cortisol 농도는 염분 노출 농도가 낮아 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3 psu에서는 다른 실험구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급격한 염분 변화는 어류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뇌-교감신경-크롬친화세포축 (brain-sympathetic-chromaffin cell axis, BSC)과 시상하 부-뇌하수체-간신선 축(hypothalamus-pituitary-interrenal axis, HPI)을 활성화하여 혈중 catecholamine과 cortisol 농도를 상승시킨다(Schreck et al., 1989;Wendelaar Bonga 1997;Chang and Hur, 1999). 이러한 관점에서 혈중 cortisol의 상승은 1차적인 스트레스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타 어종인 바리과 교잡종(Epinephaelus fuscuguttatus×E. polyphekadion)은 염분 농도가 34 psu에서 5 psu로 24시간 동안 급격히 감소하였을 때 혈중 cortisol 농도가 268.0±1.8 ng/mL로 급격히 상승하였고(Lee et al., 2020),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Hur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3 psu의 급격한 염분 노출은 붕장어 치어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혈중 cortisol 농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급격한 염분 변화에 노출된 어류는 prolactin, growth hormone, cortisol 등 다양한 호르몬을 통해 체내 삼투압을 조절하며(Mccormick, 2001), 이중 cortisol은 아가미 염류세포의 Na+-K+-ATPase 활성과 Na+-K+-ATPase α-subunit의 발현에 관여하여 염분 내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Pickford et al., 1970;Mayer-Gostan et al. 1987). 추후 붕장어 치어의 삼투압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삼투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들과 혈중 cortisol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가미는 외부 환경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로 이온 교환, 삼투압 조절, 호흡 및 면역에 관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Rombough, 2007). 어류가 급격한 염분 변화와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1차적으로 아가미의 2차새변 상피의 박리와 공포화가 발생하고, 2차적으로 상피 세포의 과다한 증생, 세포 유착 및 괴사로 인한 호흡 효율이 감소되며, 최종적으로 폐사할 수 있다(Mi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도 붕장어 치어는 노출된 염분 농도에 따라 새판 모세혈관의 혈류량 증가, 새판 상피층의 박리 및 융합, 모세혈관 확장 등이 관찰되었으며, 이와 같은 아가미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은 붕장어 폐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은 소화, 지질 저장 및 해독 과정에 관여하고, 염분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뇌와 아가미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외부 환경 스트레스에 노출 시 간세포 비대, 핵 응축, 공포화, 괴사 등과 같은 구조적 손상이 유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Strmac et al., 1999;Gisbert et al., 2008). 저염분 노출 연구에서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치어(평균 체중 24.4±6.1 g)와 점농어 치어(평균 체중 1.6±0.3 g)는 간세포 비대, 핵 응축, 공포상 지질방울 등과 같은 변화가 관찰되었고, 이러한 원인을 산화적 스트레스 또는 당, 지방, 단백질의 합성 및 방출 불균형으로 보고하였다(Yang et al., 2021;Zhou et al., 2024). 본 연구에서도 붕장어 치어는 10 및 5 psu에서 간조직 내 공포상 지질방울이 증가하였고, 3 psu에서는 간 세포의 응축 및 괴사가 발생하였다. 즉, 급격한 저염분 노출은 붕장어 치어에게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간의 구조적·기능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붕장어 치어는 33부터 10 psu의 염분에서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5 psu 이하의 염분에서는 폐사가 발생하였고, 3 psu에서 혈중 cortisol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간의 조직학적 관찰 결과, 10 및 5 psu에서 간세포 내 glycoge 축적 감소와 공포상의 지질방울이 증가하였고, 3 psu에서는 간세포의 응축, 괴사 및 지질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아가미의 조직학적 관찰 결과, 20 및 10 psu에서 새판 모세혈관 내 혈류량이 증가하였고, 5 및 3 psu에서는 새판 상피층의 박리, 융합 및 곤봉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붕장어 치어는 저염분에 강한내성을 보유한 어종으로 양성이 가능한 염분 범위는 33부터 10 psu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붕장어의 양식기술 개발에 기초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